독자들이 말하는 제주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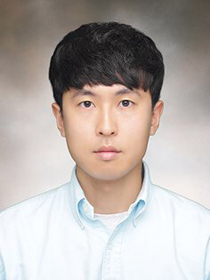
얼마 전 제2도서관에서 우연히 로비에 비치된 제주대신문을 집었다. 무려 999호. 적지 않은 숫자다.
제주대신문은 제주대학교와 함께 걸어온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제주대신문은 이곳저곳 진열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기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신문은 전보다 얇아지고 있다. 신문이 교내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대로 가면 신문 지면의 크기도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교직원 포함)는 학교신문에 관심이 없다.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제주대신문을 외면한다.
학교 신문의 입지가 작아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그저 학생들의 무관심을 탓할 수는 없다. 제주대신문에 소속된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사작성에만 힘을 쏟기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들도 학생이다. 취업전선에서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청년이다. 교직원들은 제주대신문의 정기적인 발행을 그저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업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죽어가는 대학 언론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결코 학생들만의 몫이 아니다.
학교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단지 학생기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밥 몇 끼 사주는 것은 ‘지원’이 아니다. 그건 교내 언론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홍보학과 교수들마저 손 놓은 제주대신문. 얇아진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곧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온다. 제주대신문이 창간 1000호를 맞았다. 축하할 일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교내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재학생과 학생 기자들의 문제만으로 봐선 안 된다. 제주대신문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교수를 비롯해 교직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면을 채우고 학생과 소통해야 한다. 열악한 현실과 지난한 싸움은 학생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 감당할 할 문제다.

